유시민, 나의 한국현대사 (1959~2014, 55년의 기록)
2014년 말, 서점, 포털, 언론사 등에서 꼽은 올해의 책에 어김없이 들어 있었다는 이유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소위 꼴통보수 언론사에서도 올해의 책으로 꼽고 있다는 것이 희한하기도 했기 때문이지요.
뭐랄까 많은 쟁점들에 대해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라고 평을 내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꼴보기 싫을 정도는 아니었고요, 부분부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쪽을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읽는 사람마다 좋은 부분만 형광펜으로 칠해가며 끄떡끄떡였는지도 모르겠네요.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문단('성공한 쿠데타 5.16' 중에서)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폭력으로 권력을 탈취했지만 폭력으로만 통치하지는 않았다. 자발적으로 추종하거나 지지한 국민도 많았다. 18년의 집권기간에 박정희 정부는 농업 중심의 전통사회를 중화학공업을 보유한 산업사회로 만들었다. 고속도로와 항만, 비행장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했고 헐벗은 민둥산을 숲으로 바꾸었다. 전국에 상하수도와 전기를 보급했고 기생충과 전염병을 퇴치했다. 나는 이런 것이 '커다란 선'이었다고 생각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결코 고결한 인간은 아니었으나 독재자로서는 크게 성공한 것이다.
4.19와 5.16 둘 모두 일정한 성공을 이루었다. 4.19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5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점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다만, 10년으로 끝나버린 진보세력의 집권과 심각하게 흔들리는 오늘의 민주주의는 4.19의 승리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5.16도 성공했다. 박정희 장군은 18년 동안이나 권력을 누렸으며 그 후예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12년 더 집권했다. 서거 33년이 지난 시점에 딸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되었으며, 이유가 무엇이든 그는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남아 있다. 세계사에서 이만큼 성공한 군사쿠데타는 별로 없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좋아하는 시민들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대상은 사실 그의 인격과 행위가 아니라 그 시대를 통과하면서 시민들 자신이 쏟았던 열정과 이루었던 성취, 자기 자신의 인생일 것이라고 나는 추측한다."
전체적 맥락은 그러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문장을 골라서 끊어내면, 꼴통보수들도 거봐라~ 라고 거드름을 피울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이 되는데, 이런 이유로 보수언론사들도 올해의 책 선정에 동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제점령하에서의 수탈기, 민족상잔 후의 폐허에서 불과 수십년만에(=아주 짧은 기간에)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민주주의도 발전하게 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는 없다는 것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겠으나, 이 둘이 나선형으로 또는 꽈배기처럼 같이 발전하지 못하고, 흑백 논리처럼 어느 하나를 위해서 다른 하나는 희생될 수 밖에 없다는 저 동네의 논리를 많은 부분 수긍해주는 것과 같은 뉘앙스는 사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를 살아가는 다수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니, 내가 이상한 놈이고, 내가 바라는 세상이 너무나 이상적인 거겠지요? 아니면 말고.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구절이 있네요.
"민주주의는 최선의 인물이 권력을 장악해 최대의 선을 실현하도록 하는 제도가 아니다.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아도 악을 마음껏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민주주의의 정의와도 같은 이 구절에 나는 동의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제대로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다수의 사람들은 현재의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며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니, (이런 이야기가 논쟁거리라도 되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오늘날 다수의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집권당의 형태를 용인한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생각하며 상당기간 동안 제법 큰 격차로 야당이 아닌 집권당을 지지했다. 민주주의 성숙도는 주권자인 시민의 의식과 행태가 좌우한다. 집권세력의 반민주적 형태는 대통령과 여당 정치인들의 교만과 성숙하지 않은 시민의식을 반영한다."
그래서, 고쳐야 할 대상으로 바꾸어야 할 대상으로 우리를 지목하네요.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욕망 피라미드의 아래쪽에 있는 '생리적 욕망'과 '안전에 대한 욕망' 충족에 지나치게 집착해 살면서 '자기존중'과 '자아실현의 욕망'을 후순위로 밀어두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권력을 얻는 일에 매달려 자기 자신과 타인의 존엄을 무시하고 팽겨쳤다. 협력보다 경쟁에, 원칙과 상식보다 반칙과 편법에, 인간적 공감과 연대의식보다 자기중심적 이해타산에 끌리며 살았다. 세월호의 비극은 그렇게 달려온 욕망의 대한민국현대사가 도달한 곳이 어디인지를 보여주었다."
'우리'가 포함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묻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잠실 동네에 없던 씽크홀이 나타나고, 천정이 갈라지고, 영화관이 흔들리고, 공사에 참여한 노동자가 추락사를 거듭해도, 제2롯데월드의 운영과 공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놔두고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 백화점에서 마트에서 VIP 고객이랍시고, 주차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무릅 꿇리고 욕설을 퍼붓는 갑질을 하는 사람도 '우리'인가? 고조선 최대의 유적지가 발견되었는데, 쓰레기처럼 가져다버리고, 여기에 레고랜드를 짓겠다고 하고, 이를 허용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인간들도 '우리'인가?
저자는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2014년의 대한민국은 결코 완벽하고 훌륭한 사회가 아니다. 수치심과 분노, 슬픔과 아픔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1959년의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거의 모든 면에서 다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훌륭하다.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점이 55년 전보다 훌륭한가? 무엇이 그 변화를 만들었는가? 어떤 면이 아직도 부끄럽고 추악하며 앞으로 우리는 어떤 변화를 더 이룰 수 있을까? 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전세계 국가들 중에서, 대다수가 55년전과 비교하여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후퇴라도 했는데, 우리만 이렇게 잘 나갔는가?
저자는 서문에서 '자학적 역사인식', '자아도취적 역사인식'을 하지 말자고 했는데, 책을 덮을 때의 느낌은 저자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워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랄까 많은 쟁점들에 대해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라고 평을 내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꼴보기 싫을 정도는 아니었고요, 부분부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쪽을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읽는 사람마다 좋은 부분만 형광펜으로 칠해가며 끄떡끄떡였는지도 모르겠네요.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문단('성공한 쿠데타 5.16' 중에서)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폭력으로 권력을 탈취했지만 폭력으로만 통치하지는 않았다. 자발적으로 추종하거나 지지한 국민도 많았다. 18년의 집권기간에 박정희 정부는 농업 중심의 전통사회를 중화학공업을 보유한 산업사회로 만들었다. 고속도로와 항만, 비행장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했고 헐벗은 민둥산을 숲으로 바꾸었다. 전국에 상하수도와 전기를 보급했고 기생충과 전염병을 퇴치했다. 나는 이런 것이 '커다란 선'이었다고 생각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결코 고결한 인간은 아니었으나 독재자로서는 크게 성공한 것이다.
4.19와 5.16 둘 모두 일정한 성공을 이루었다. 4.19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5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점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다만, 10년으로 끝나버린 진보세력의 집권과 심각하게 흔들리는 오늘의 민주주의는 4.19의 승리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5.16도 성공했다. 박정희 장군은 18년 동안이나 권력을 누렸으며 그 후예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12년 더 집권했다. 서거 33년이 지난 시점에 딸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되었으며, 이유가 무엇이든 그는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남아 있다. 세계사에서 이만큼 성공한 군사쿠데타는 별로 없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좋아하는 시민들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대상은 사실 그의 인격과 행위가 아니라 그 시대를 통과하면서 시민들 자신이 쏟았던 열정과 이루었던 성취, 자기 자신의 인생일 것이라고 나는 추측한다."
전체적 맥락은 그러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문장을 골라서 끊어내면, 꼴통보수들도 거봐라~ 라고 거드름을 피울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이 되는데, 이런 이유로 보수언론사들도 올해의 책 선정에 동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제점령하에서의 수탈기, 민족상잔 후의 폐허에서 불과 수십년만에(=아주 짧은 기간에)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민주주의도 발전하게 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는 없다는 것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겠으나, 이 둘이 나선형으로 또는 꽈배기처럼 같이 발전하지 못하고, 흑백 논리처럼 어느 하나를 위해서 다른 하나는 희생될 수 밖에 없다는 저 동네의 논리를 많은 부분 수긍해주는 것과 같은 뉘앙스는 사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를 살아가는 다수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니, 내가 이상한 놈이고, 내가 바라는 세상이 너무나 이상적인 거겠지요? 아니면 말고.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구절이 있네요.
"민주주의는 최선의 인물이 권력을 장악해 최대의 선을 실현하도록 하는 제도가 아니다.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아도 악을 마음껏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민주주의의 정의와도 같은 이 구절에 나는 동의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제대로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다수의 사람들은 현재의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며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니, (이런 이야기가 논쟁거리라도 되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오늘날 다수의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집권당의 형태를 용인한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생각하며 상당기간 동안 제법 큰 격차로 야당이 아닌 집권당을 지지했다. 민주주의 성숙도는 주권자인 시민의 의식과 행태가 좌우한다. 집권세력의 반민주적 형태는 대통령과 여당 정치인들의 교만과 성숙하지 않은 시민의식을 반영한다."
그래서, 고쳐야 할 대상으로 바꾸어야 할 대상으로 우리를 지목하네요.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욕망 피라미드의 아래쪽에 있는 '생리적 욕망'과 '안전에 대한 욕망' 충족에 지나치게 집착해 살면서 '자기존중'과 '자아실현의 욕망'을 후순위로 밀어두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권력을 얻는 일에 매달려 자기 자신과 타인의 존엄을 무시하고 팽겨쳤다. 협력보다 경쟁에, 원칙과 상식보다 반칙과 편법에, 인간적 공감과 연대의식보다 자기중심적 이해타산에 끌리며 살았다. 세월호의 비극은 그렇게 달려온 욕망의 대한민국현대사가 도달한 곳이 어디인지를 보여주었다."
'우리'가 포함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묻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잠실 동네에 없던 씽크홀이 나타나고, 천정이 갈라지고, 영화관이 흔들리고, 공사에 참여한 노동자가 추락사를 거듭해도, 제2롯데월드의 운영과 공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놔두고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 백화점에서 마트에서 VIP 고객이랍시고, 주차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무릅 꿇리고 욕설을 퍼붓는 갑질을 하는 사람도 '우리'인가? 고조선 최대의 유적지가 발견되었는데, 쓰레기처럼 가져다버리고, 여기에 레고랜드를 짓겠다고 하고, 이를 허용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인간들도 '우리'인가?
저자는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2014년의 대한민국은 결코 완벽하고 훌륭한 사회가 아니다. 수치심과 분노, 슬픔과 아픔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1959년의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거의 모든 면에서 다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훌륭하다.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점이 55년 전보다 훌륭한가? 무엇이 그 변화를 만들었는가? 어떤 면이 아직도 부끄럽고 추악하며 앞으로 우리는 어떤 변화를 더 이룰 수 있을까? 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전세계 국가들 중에서, 대다수가 55년전과 비교하여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후퇴라도 했는데, 우리만 이렇게 잘 나갔는가?
저자는 서문에서 '자학적 역사인식', '자아도취적 역사인식'을 하지 말자고 했는데, 책을 덮을 때의 느낌은 저자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워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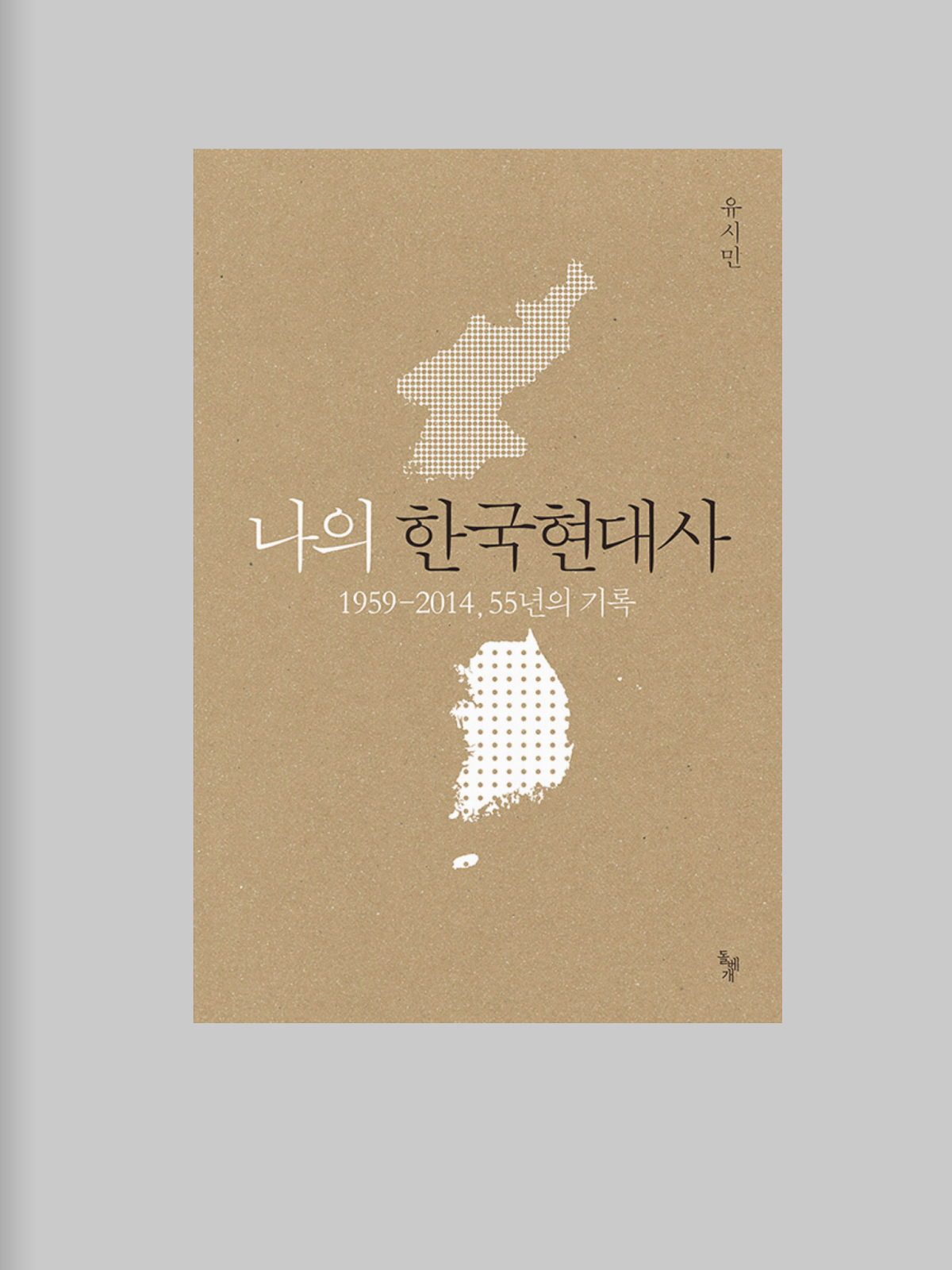


댓글
댓글 쓰기